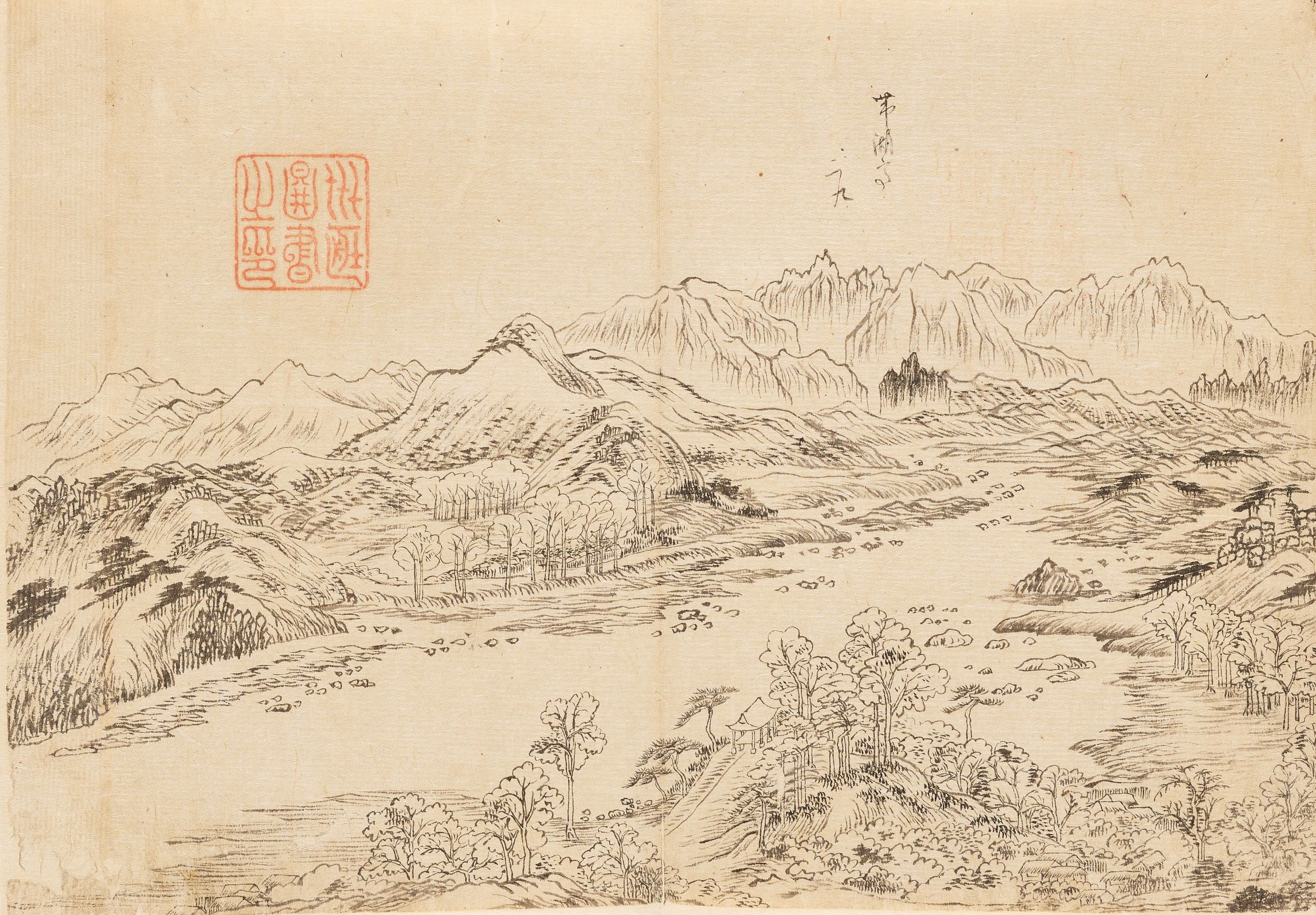풍랑이 심하여 8월 21일은 배를 평도 항구 깊숙한 곳으로 옮겨 정박했다가, 22일 새벽에 순풍을 얻어 순식간에 황성도를 지나고, 한낮에는 진주문(眞珠門)을 거쳐 묘도(廟島) 앞 항구에 다다랐다. 묘도에서 등주까지는 80리라고 기록되었으니 마침내 육지인 등주(登州)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여섯 척의 배 중에 5척은 도착했지만 제4선으로 불리는 배는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도 험난한 바다를 무사히 건너온 기쁨에 사신 일행은 그날 저물녘에 신녀묘(神女廟) 앞으로 배를 옮기고 제문을 지어 해신(海神)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올렸다. 홍익한은 “이날 밤에 바람은 자고 물결은 고요하니, 뱃길을 떠난 후에 비로소 편안히 잠잘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 다음날 저녁나절에 제4선이 뒤늦게 도착했다. 황성도(皇城島) 앞바..